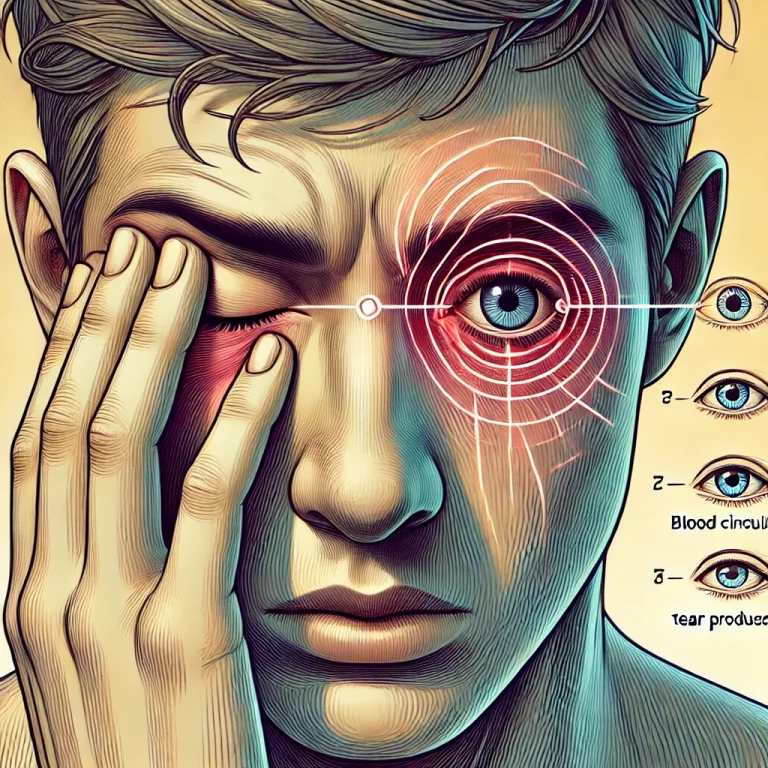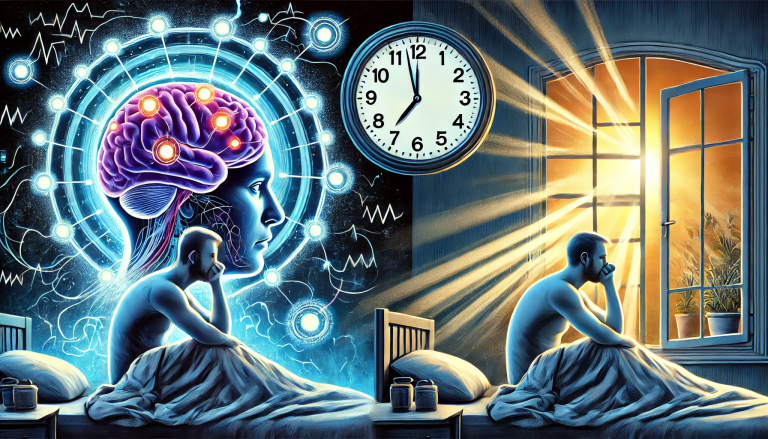“공매도는 정당한 투자일까, 제도권 투기의 허점일까?”
“공매도는 정당한 투자일까, 제도권 투기의 허점일까?”
공매도, 즉 ‘떨어질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뒤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은 오늘날 주식시장에서 매우 논란이 많은 제도입니다. 한쪽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개인 투자자를 희생시키는 투기적 수단”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 방식은 과연 정당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제한하거나 폐지되어야 할 위험한 도구일까요?
공매도의 기원은 17세기 네덜란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 주식이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서 활발히 거래되던 중, 투자자 아이작 르 메르가 경영진과의 갈등으로 주식을 대량 공매도하며 주가를 폭락시켰고, 이로 인해 정부는 공매도를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8세기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20세기 미국에 이르기까지 공매도는 주기적으로 시장 혼란의 중심에 서며 규제와 완화 사이를 오갔습니다. 1929년 대공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3년 한국의 무차입 공매도 사태까지, 공매도는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시장 충격과 연결돼 왔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구조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로 작용해 왔습니다. 상환 기한, 담보 조건, 정보 접근성, 거래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유리한 조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었고, 2023년에는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의 공매도 위반으로 인해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허점과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공매도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과연 공매도라는 행위 자체가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투자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정말로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인지, 아니면 정보와 자금의 비대칭성이 심화된 시장에서 소수 세력만을 위한 투기 도구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번 연구 주제는 **‘공매도의 역사적 진화와 제도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입니다. 큐니버시티 연구원 여러분,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공매도 제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장에 필요한 장치인지, 아니면 과거의 유물로 정리되어야 할지를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함께 탐구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출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