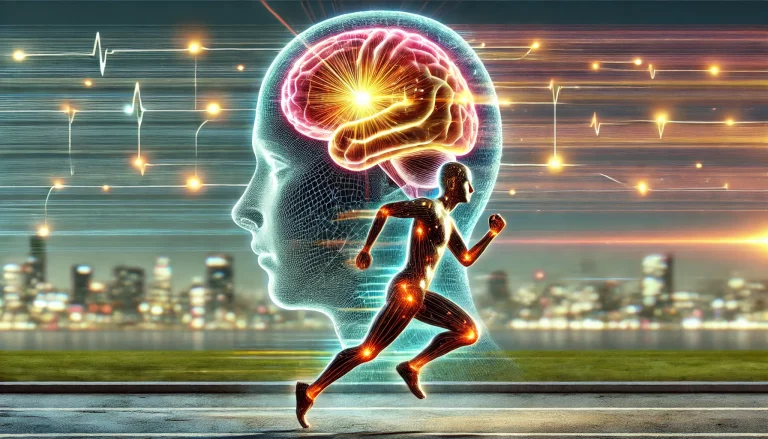정신과에 다녔는데도… 왜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났을까? 연예인 자살과 한국 정신의료 시스템의 역설
정신과에 다녔는데도… 왜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났을까? 연예인 자살과 한국 정신의료 시스템의 역설
2017년 샤이니의 종현, 2019년 설리와 구하라, 그리고 2025년 김새론.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라기엔 너무도 비슷한 시기와 비슷한 맥락, 그리고 너무도 반복된 죽음들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충격에 빠졌고, 일부에서는 이들이 같은 정신과를 다녔다는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괴담이 아니라 이 사건들이 우리 사회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 정말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들을 막지 못했을까요?
정신의학은 우울증, 불안장애, 충동조절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약 50%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자살 시도 또는 극단적 선택 위험이 존재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약물 치료만으로는 감정의 깊은 고립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직업군은 대중의 시선, 비난, 고립된 생활 패턴, 지나친 완벽주의와 자기검열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외부의 강력한 심리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합니다. 셋째, 치료의 목적이 단지 ‘증상 완화’에 국한될 경우, 삶의 의미나 관계 회복, 실존적 지지는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이 죽음을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상담에 대한 편견, 자살 관련 대화의 금기시가 오히려 위험 신호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도 위험한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공감받지 못했고, 살아있지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채 떠난 이들의 삶은, 한국 사회가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대한 거울입니다.
이번 연구 주제는 ‘연예인 자살과 한국 정신의료 시스템의 한계: 예방의 실패인가, 사회적 책임의 회피인가’입니다. 큐니버시티 연구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이 문제를 덮을 수 없습니다. 사회 구조, 치료 시스템, 정서적 연결망의 부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정신건강 체계”란 무엇인지를 탐구해 논문으로 출간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가 뜨거우시다고요?”… 한국어 높임말 ‘-시-‘는 지금 어디까지 진화했는가?
“커피가 뜨거우시다고요?”… 한국어 높임말 ‘-시-‘는 지금 어디까지 진화했는가?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누가 가르쳤을까?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누가 가르쳤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