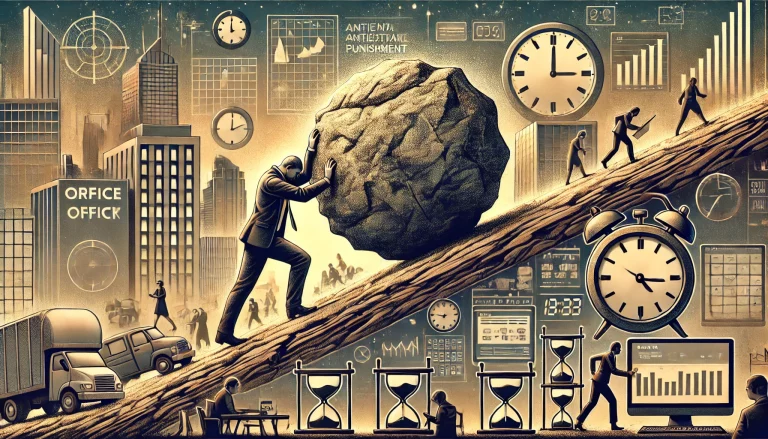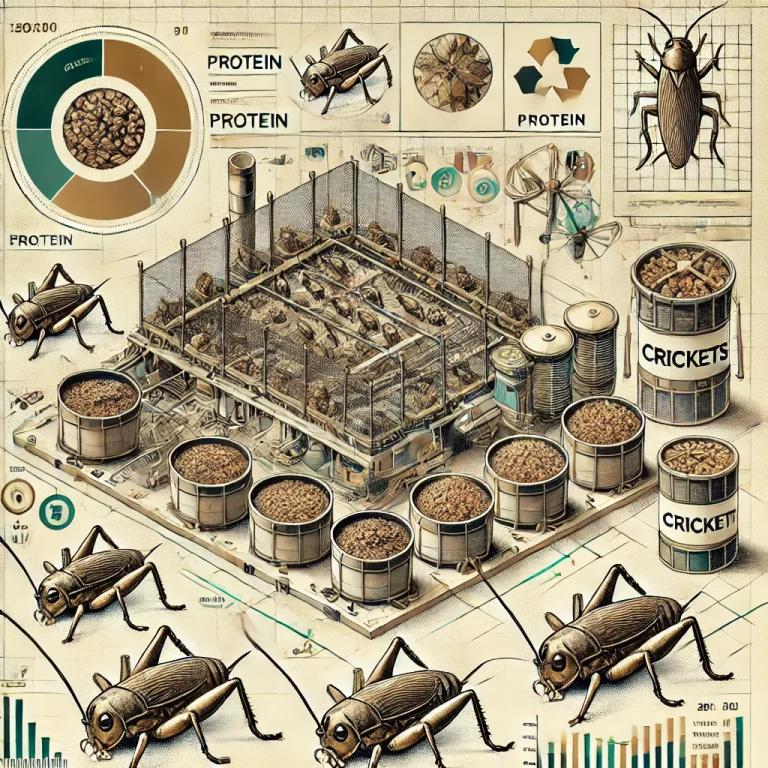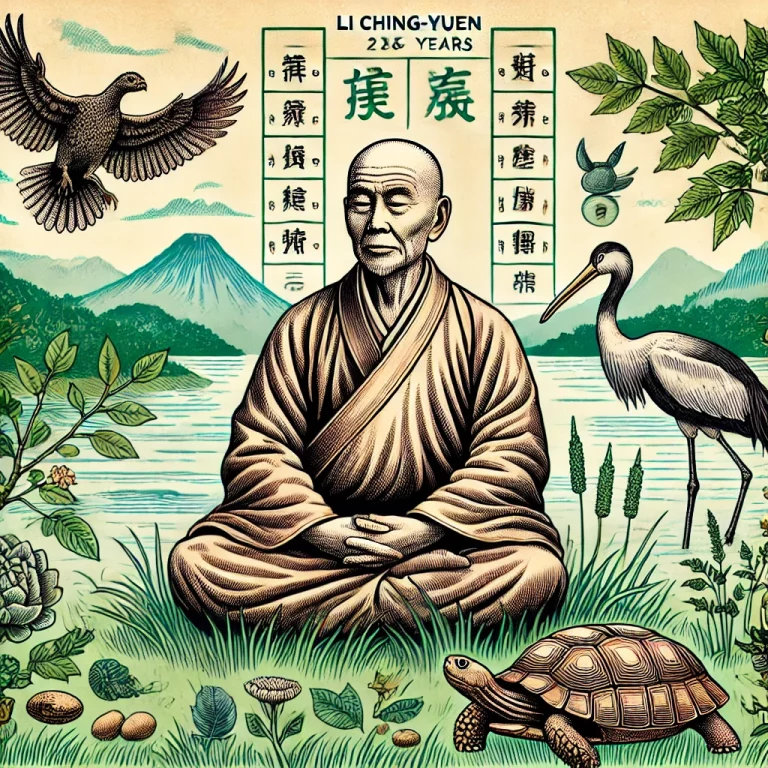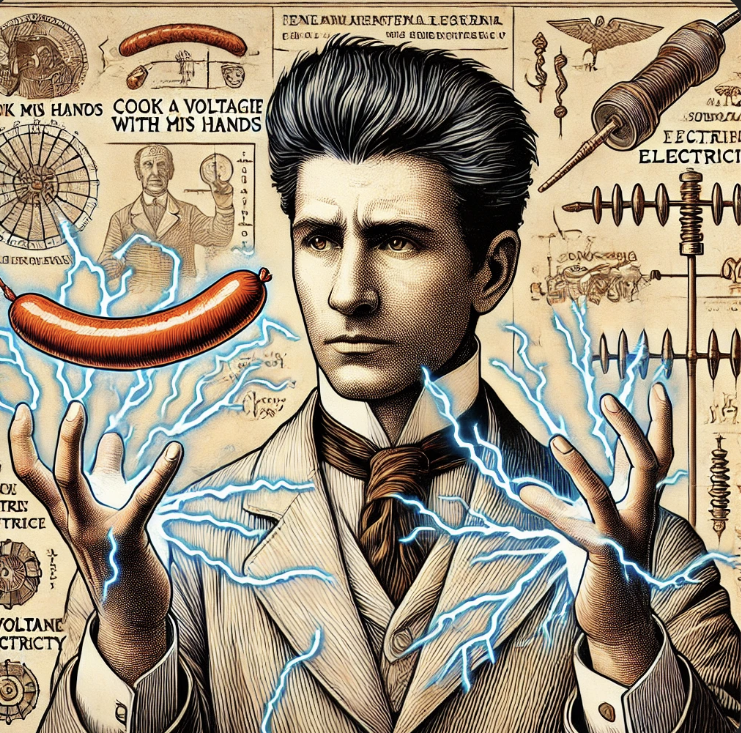🌈 왜 ‘노래’는 있어도 ‘초래’, ‘보래’는 없을까? 색깔 형용사의 비밀을 파헤친다!
한국어에서 색깔을 나타내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언어학적 규칙과 불규칙은 꽤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렇게 바랜 색을 ‘노랗다’ 대신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창문틀이 노래졌다’, ‘종이가 노래서 오래돼 보여’처럼 말이지요. 이와 비슷하게 ‘빨갛다’는 ‘빨개’, ‘하얗다’는 ‘하얘’로 쓰이는 경우도 흔히 보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초록색이 바래서 초래졌다’, ‘보랏빛이 옅어져 보래졌다’, ‘남색이 흐려져 남래졌다’ 같은 표현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런 유사어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자주 안 쓰여서일까요, 아니면 문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서일까요?
이 현상은 사실 한국어의 색채 형용사 어미 변화의 체계성과 역사적 어형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래’, ‘빨개’, ‘하얘’, ‘까매’ 등은 ‘노랗다’, ‘빨갛다’, ‘하얗다’, ‘까맣다’ 등과 같은 ‘~하다’형 색채 형용사에서 파생된 구어형 어미입니다. 이 형용사들은 기본적으로 불규칙 활용 동사로 분류되며, ㅎ 불규칙 변화가 일어나 ‘ㅎ’ 탈락과 함께 모음 변화가 동반됩니다. 예를 들어 ‘노랗다’ → ‘노래졌다’, ‘하얗다’ → ‘하얘졌다’와 같은 형태죠.
반면, ‘초록’, ‘보라’, ‘남색’과 같은 색 이름들은 기본적으로 명사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형용사 활용이 아니라, ‘초록색이다’, ‘보라색이다’처럼 이다 계열의 서술어로 처리되어 형용사 어간 변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래졌다’ 같은 표현은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 주제는 바로 “한국어 색채어의 문법적 분류와 활용형 변화: 왜 어떤 색만 ‘노래’, ‘빨개’로 표현되는가?”입니다. 큐니버시티 연구원 여러분, 이 주제를 통해 색채어의 역사적 어원, 활용형의 문법적 범주화, 구어와 문어의 차이, 방언에서의 다양성까지 탐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어에서 파생된 관용 표현이 어떻게 표준어로 정착했는지, 또는 어떤 표현은 왜 정착하지 못했는지를 분석하는 국어사와 형태론적 통합 연구로 발전시켜 보세요.